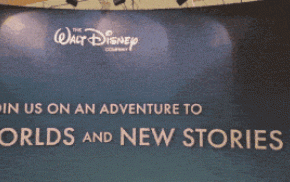#장병규 크래프톤 의장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뜻밖이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가 그 역할의 적임자인지에 대한 판단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더 그랬다. 오류투성이의 선입견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겠는데, 장 위원장의 경우 대통령이 탐낼만한 인물이긴 하지만, 요구가 있어도 고사할 사람이라고 봤었다.
#장 위원장을 개인적으로 처음 대면한 것은 2006년 여름이다. 강남의 한 호텔 커피숍이었다. 그가 창업한 검색엔진 회사 ‘첫눈’을 네이버에 매각한 직후다. 당시 33살인 그의 첫 인상은 그야말로 ‘첫눈’ 같았다. 순수하고 맑았다. 뛰어난 엔지니어 출신의 경영자였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여러 면에서 겹쳐졌다. ‘첫눈’ 매각 대상이 네이버였던 이유 또한 그것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첫눈’ 매각 이후의 활동도 꾸준히 지켜봐왔다. 매각 대금으로 창업투자 회사를 차려 후배 벤처 기업가를 지원하는 모습들, 게임 개발회사를 차려 또다시 크게 히트치는 장면들을 기억한다. 그러는 사이에 한두 번 더 보았다. 1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났지만 장 위원장은 첫 대면 때와 별로 다르지 않았다. 크게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수하고 맑았으며 겸손했다. 그리고 내성적이었다.

#장 위원장을 눈여겨 봐온 까닭은 이런 성격의 소유자들이 창업을 하고 성공한 경우가 드물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동안 봐온 많은 경영자들에 대한 선입견 탓인지도 모른다. 창업과 경영은 거의 전쟁과 다름없다.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백 개의 얼굴과 천 개의 지략’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도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에서 적잖은 족적을 남겼다는 점에 두고두고 관심이 갔다.
#장 위원장의 사업적 성취는 그 점에서 연구가치가 있다. 좀 독특한 해석일 순 있겠지만, ‘사업적 성공’이라기보다는 ‘예술적 성공’이라는 생각까지 해보았다. 누군가와의 치열한 경쟁과 싸움을 통해 승자가 됐다기보다 자신에 대한 집요한 탐구로 만들어낸 결과물이 대중의 호응을 얻었다는 점에서 그렇게 본 것이다. 그가 싸웠던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고객을 위해 자신을 극복하는 일이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됐다는 소식이 좀 뜻밖이었던 건 그런 그가 이런 종류(천 개의 얼굴과 만 개의 지략이 필요하고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의 일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먼저 앞섰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수긍한 까닭은 그의 가슴에 있던 ‘애국심’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겠다는 구글을 외면하고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첫눈’을 넘겼던 사례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를 발탁한 까닭은 이런 특장을 높이 샀기 때문일 것이다. 기술 산업과 벤처 창업 과정에 대한 높은 이해도, 순수하고 맑은 영혼, 정직한 품성 등이 그것이다. 장 위원장이 스스로 제 자리가 아닌 줄 알면서도 이를 수용한 것은 아마도 애국심의 발로였을 터다. 4차 산업혁명의 거센 파고가 밀려오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를 잘 대비해야 한다는 건 너무 자명하므로.
#장 위원장은 지금 두 번 째 임기를 막 지나고 있다. 그가 이 막중한 역할을 맡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다. 그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인데다 늘 자기 스스로와 분투하는 사람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세상에 떠도는 이런저런 평가를 오지랖 넘게 대신 전해줄 생각도 없다. 다만 ‘기술에 있어 정치의 중요성’을 함께 논해보고 싶은 생각은 크다.
#‘4차 산업혁명’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그것이 주는 숙제는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경제적 부(富)를 위해서 첨단 기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의 문제다. ‘혁신성장’이란 정책 용어로 압축할 수 있다. 기술 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해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과업이라 할 수 있겠다. 둘째, 이 과정에 필연코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회 갈등을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의 과제다.
#문제는 두 번째 과제에 대한 지혜를 갖지 못하면 첫 번째 숙제 또한 쉽사리 답을 찾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기술은 그 자체로 두면 기필코 승자와 패자를 나누고 빈익빈부익부를 심화시킨다. 기술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사회갈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 갈등의 폭과 깊이가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넓고 깊다.
관련기사
- 국내 유튜브의 최대 지원군은 문재인 정부?2019.05.15
- 혁신성장, ‘기술+정치’로 풀어야 답 나온다2019.05.15
- 최초 폴더블폰이 불러올 ‘승자의 저주’②2019.05.15
- 안철수가 뭘 배우고 있을 지 궁금하다2019.05.15
#이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은 타협이다.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사회적 대타협. 그리고 그에 기반한 법제도의 정비. 또 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소통이다. 더 행복한 미래를 같은 시선으로 그려낼 수 있는 진정어린 소통. 이 모든 일이, 사실은, 우리 대중이 그리고 기술주의자들이 그렇게도 혐오하는 ‘정치’다. 하지만 모두 다 이 일을 포기한다면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기술 정글’이 되고 말 것이다.
#이를 고민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은 소통을 위한 ‘설득의 무기’를 장착해야 한다. 기술 주도자에게는 ‘상생의 소중한 가치’를 설득해야 하고, 기술 피해자들에게는 ‘혁신의 빛나는 성장’을 설득해야 한다. 그 일은 북(北)과 미(美)를 한 테이블에 앉히는 것에 비해 결코 쉽지 않다. 하나하나의 안건들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무적(政務的)이어야 하는 것은 그래서 빛나는 의무이자 과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