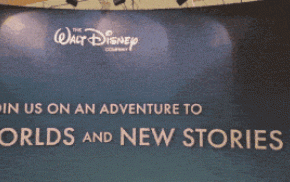“아픈 지적이다.”
지난 22일 서울시가 정부예산으로 저소득층에 쌀과 밑반찬을 사먹을 수 있도록 한 ‘식품바우처’를 실시하겠다고 한 날, 중앙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할인을 민간사업자인 통신사에게 맡기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묻자 정부 관계자가 한 말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 요금할인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 이를 왜 통신 산업에서만 민간에 떠넘기느냐는 지적이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방송통신사업자로부터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로 걷어 들인 금액이 지난 2년간 연평균 1조3천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약 1조원으로 추산되며 공공재인 주파수를 방송?통신사에 빌려주고 받는 재원인 만큼 이를 가계통신비 인하에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편입되는데 대부분 방송콘텐츠 육성과 연구 지원에 쓰인다.

업계 한 전문가는 “지난 2011년 국내에 처음으로 주파수 경매제도가 도입되면서 주파수 할당대가가 크게 증가해 통신사들의 부담이 늘어났다”며 “정부가 해야 할 복지사업을 민간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주파수 할당대가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쓰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실제, 첫 주파수 경매가 실시된 2011년에는 1.8GHz(9천955억원), 800MHz(2천610억원), 2.1GHz(4천455억원) 대역의 최종 경매가격이 총 1조7천15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경매제 도입 직전인 2010년에 대가할당 방식으로 결정된 800MHz, 900MHz 대역의 할당대가는 각각 2천500억원, 2.1GHz는 532억원이었다. 경매제가 도입되면서 할당대가가 급증한 것이다. 때문에 당시 업계에서는 해외에서 과도한 경매대가로 통신사의 사업권 반납이나 투자 위축 등의 부작용이 있다며 주파수 할당대가를 낮춰야 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밖에도 정부는 이동통신사에게 분기별로 가입자당 2천원씩의 전파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이를 면제받는 알뜰폰 사업자를 제외하더라도 이 금액 역시 연간 약 2천4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전파사용료도 통신 복지가 아닌 기획재정부의 일반 회계 재원으로 편입되고 있다.
특히, 매년 6천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지출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이통사의 주파수 할당대가로 70%, 지상파방송의 광고매출 15%, 홈쇼핑?유료방송사 15% 등으로 조성되지만 이 중 통신에 사용되는 금액은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과 농어촌 광대역망 구축 등 260억원(1.8%) 정도가 집행되는 실정이다.
또 이명박 정부에서 정보통신부가 해체되고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폐합되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설립되기 전까지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지식경제부가 재원을 관리했다. 조성하는 주체와 이를 사용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비판 때문에 다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정보통신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관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쓰임새가 바뀌지 않았다.
특히, 해외 선진국들은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 중 하나 만을 납부하고 있는데 국내 통신사들을 이를 모두 부담하고 있어 이중과세란 지적도 나온다. 미국, 영국, 독일은 주파수 할당대가만을 지불하고 있으며 일본은 전파사용료만 내고 있다.
관련기사
- 와이브로 주파수 일부, LTE 전환 활용 검토2017.06.30
- 미래 주파수 정책도 '4차 산업혁명' 대비2017.06.30
- "5G 황금주파수 빨리 확보해 달라"2017.06.30
- 사물인터넷 활성화, 주파수 규제 푼다2017.06.30
업계 한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는 사실상 준조세 성격을 띠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모두 내고 있어 매출 대비 4.5%에 이른다”며 “해외 주요 통신사들의 비율이 3%라는 점을 감안하면 과다한 수준이고 주파수 경매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가 특정 목적을 갖고 걷는 사실상의 준조세라면 이는 해당 산업의 복지예산으로 쓰는 것이 옮다”며 “이를 일반예산처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