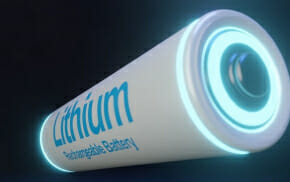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두 명의 독일인이 주목받고 있다.
한 명은 세계경제포럼(WEF)을 통해 4차산업혁명 담론을 전 세계로 확장시키고 있다. 또 한 명은 제조업 강국 독일의 변신을 이끈 인더스트리 4.0을 주도하고 있다.
클라우스 슈밥과 헤닝 카거만. 4차산업혁명 담론과 실천을 대표하는 두 사람 모두 독일 출신이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나란히 한국을 찾으면서 4차산업혁명 관련 얘기를 풀어놓는다.

4차산업혁명 화두로 한국을 찾은 건 슈밥이 먼저였다. 슈밥은 지난 해 10월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해 많은 얘기를 풀어놓고 갔다.
슈밥의 뒤를 이어 카거만도 한국땅을 밟는다. 오는 29일 지디넷코리아와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주최로 열리는 ‘독일 인더스트리 4.0을 통해본 한국형 4차산업혁명 모델’ 컨퍼런스에서 특별 강연을 할 계획이다. (☞ 4차산업혁명 컨퍼런스 바로 가기)
■ 슈밥, 작년 다보스포럼 계기로 4차산업혁명 아이콘 등극
세계경제포럼을 이끌고 있는 슈밥은 독일 라벤스부르크 출신이다. 1938년생으로 올해 80세인 그는 여전히 현역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지금은 세계경제포럼 회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실 슈밥은 일찍부터 학문적인 역량을 꽃피웠다. 미국 잡지 배너티페어에 따르면 슈밥은 27세까지 다섯 개 학위를 취득했다.
프리부르대학 경제학 박사, 스위스 취리연방공과대학 공학 박사 등이 그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학위다. 또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의 행정학 석사 학위도 갖고 있다. 그 뿐 아니다. 슈밥은 31세이던 1969년 제네바대학 교수로 임용되면서 스위스 최연소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슈밥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해는 1971년이었다. 33세이던 그 해에 슈밥은 유럽경제포럼을 결성했다. 그리곤 서유럽 경영자 444명을 스위스 다보스로 초대해 첫 행사를 가졌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소박했던 이 모임은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를 뜨겁게 달구는 포럼의 기초가 됐다. 슈밥은 1987년 이름을 세계경제포럼으로 바꾸면서 시선을 전 세계로 돌렸다.
이후 세계경제포럼은 전 세계 명망가들이 꼭 서고 싶어하는 꿈의 무대로 성장했다.
배너티페어에 따르면 슈밥은 매년 세계경제포럼을 1천개 회원사들에게만 공개한다. 세계경제포럼 회원사들은 매년 회비 3만9천 달러를 내고 있다. 다보스포럼에 참가하기 위해선 2만 달러를 추가로 내야 한다. 하지만 정부, 비영리단체, 언론사 관계자들은 무료로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던지는 화두는 그 해 세계인의 관심을 사로잡는다. 빌 게이츠 역시 2007년 세계경제포럼을 통해 ‘창조적 자본주의’란 자신의 철학을 널리 설파했다.
갑작스럽게 4차산업혁명 열풍이 분 것도 세계경제포럼과 슈밥 덕분이었다. 세계경제포럼은 지난 해 초 다보스포럼 때 ‘일자리의 미래’란 보고서를 통해 4차산업혁명 화두를 본격적으로 던졌다.
슈밥은 그 무렵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장문의 글을 발표하면서 이런 담론에 힘을 실어줬다. 이후 지능정보사회를 비롯한 여러 용어들을 제치고 4차산업혁명이 현 시대를 대표하는 용어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 카거만, 독일 제조업 부활의 아이콘
슈밥이 이론 영역에서 설파한 4차산업혁명 담론을 헤닝 카거만은 직접 실천했다. 카거만은 일찍부터 독일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경제 정책으로 ‘인더스트리 4.0’을 외쳤다.
카거만은 1948년 독일 중부 니더낙센주에 있는 브라운슈바이크 출신이다. 뮌헨공대에서 물리학 학사와 석사 과정을 끝낸 뒤 1975년 브라운슈바이크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0년부터 모교인 브라운슈바이크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던 카거만은 2년 뒤인 1982년 독일을 대표하는 IT기업 SAP로 자리를 옮겼다.
슈밥과 달리 카거만은 이 때부터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잔뼈가 굵었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SAP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독일을 대표하는 경영자로 자리매김했다.

SAP를 떠난 카거만은 독일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공학한림원(acatech) 회장에 취임했다. 그리고 이 곳에서 그는 ‘인더스트리 4.0’이란 화두를 던진다.
카거만의 인더스트리 4.0은 현실 속에서 탄생한 작품이다. 특히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강점이던 독일 제조업이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 중요한 계기가 됐다.
여기에다 그 무렵 IT업계의 화두였던 사물인터넷(IoT)을 비롯한 첨단 스마트 기술 활용이란 또 다른 문제 의식을 함께 담아내면서 인더스트리 4.0이란 작품이 나왔다.
카거만은 인더스트리 4.0 워킹그룹 공동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2013년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다. 사실상 독일 제조업 부흥의 밑그림을 그려낸 셈이다.
카거만이 최종 보고서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전달하는 장면은 인더스트리 4.0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 사진으로 널리 사용됐다.
■ 이론과 실천의 두 거장, 어떤 메시지 던질까
카거만과 슈밥.
같은 듯 다른 두 독일인은 미래 산업과 관련해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한 사람은 이론의 영역에서, 또 한 사람의 실천의 영역에서.
물론 국내 인지도는 큰 차이가 있는 편이다. 세계경제포럼 덕분에 클라우스 슈밥은 국내에도 널리 알려졌다.
반면 헤닝 카거만은 B2B 기업 SAP 회장으로 주로 활약하다보니 무게에 비해 일반인들에겐 널리 알려지지 않은 편이다. 독일 인더스트리 4.0 역시 세계경제포럼의 4차산업혁명 화두에 비해선 다소 생소하다.
하지만 인더스트리 4.0은 세계경제포럼을 중심으로 한 4차산업혁명 화두 못지 않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관련기사
- 독일 인더스트리4.0, 한국에서도 통할까2017.03.23
- 로봇 통역사, 평창올림픽서 언어장벽 허물까2017.03.23
- 독일 '4차산업혁명' 이끈 카거만이 온다2017.03.23
- 제조업 4차산업혁명…관건은 수요 조직화다2017.03.23
일단 독일은 세계경제포럼보다 5년 앞서 사물인터넷을 비롯한 첨단 기술이 불러올 변화에 주목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이론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 현장에 접목해 성공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카거만이 이달 말 풀어놓을 이야기 보따리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건 그 때문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