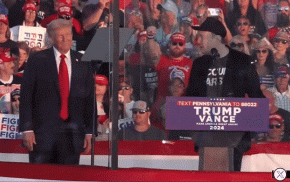올해 통신업계의 화두는 단연 ‘주파수’다. 신문지상은 연일 주파수 경매 관련 소식으로 장식되고 이동통신3사는 노동조합까지 나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달 중으로 예정된 경매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통신사들은 저마다 전략 수립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주파수는 왜 중요할까? 또 통신사들은 왜 이를 놓고 말 그대로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일까?
우선,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파수가 필수적이다. 우리는 주파수라는 통로를 이용해 음성통화, 데이터 통신 등을 사용한다. 문제는 주파수 대역이 한정돼 있고 대역폭이 전달하는 정보량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이 무선통신의 가장 큰 이슈인 이유다.
특히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이 확산되고 3G, LTE, LTE-어드밴스드(LTE-A)까지 상용화되면서 데이터 트래픽 사용량 폭증에 따른 주파수 추가 확보가 시급해진 상태다. 이용자가 늘어나면 데이터 통신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을 생각해보면 된다.

어떠한 주파수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통신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도 차이난다. 즉, 주파수가 통신사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셈이다. “황금주파수”, “통신 산업은 주파수가 8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예컨대 과거 2G 시절 SK텔레콤은 저주파 대역인 800MHz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사용하며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자리매김했다. 당시 SK텔레콤은 저주파가 고주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파수 도달거리가 길고 건물이 많은 도심에서도 잘 터진다는 점을 들어 “명품 011”, “스피드 011” 등의 마케팅을 벌였다.
최근에는 데이터 통신이 활성화되면서 저주파, 고주파 대역의 차이보다는 글로벌 확산 여부가 ‘황금주파수’의 요건이 됐다. 통신사들이 1.8GHz 대역을 놓고 으르렁거리는 이유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 통신사업자들이 LTE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주파수는 어떻게 확보하느냐. 주파수는 공공재로 수요의 존재여부에 따라 할당, 혹은 회수 및 재배치된다. 우리나라는 과거 정부가 심사를 통해 주파수를 통신사에 나눠주는 대가할당 방식이었지만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경매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가 두 번째 주파수 경매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달 중으로 1.8GHz, 2.6GHz 대역에 대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미 이통3사의 접수를 받아 적격심사에 들어갔으며, 지난 8일에는 경매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논란이 되는 것은 1.8GHz 대역이다. 상황을 요약하자면 KT는 기존 LTE 전국망을 서비스하고 있는 대역(D블록)과 인접한 대역을 차지하기 위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이다. 기존의 1.8GHz 대역은 KT가 LTE 전국망으로, SK텔레콤이 LTE 보조망으로 사용 중이다. LG유플러스는 1.8GHz 대역을 2G망으로 활용 중이었다.
2G 종료가 늦어져 LTE에서 한 발 뒤쳐진 KT로서는 1.8GHz D블록 확보에 사활을 건 상태다. 이미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기존 LTE보다 두 배 빠른 LTE-A를 상용화한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KT가 D블록을 확보할 경우 기존 LTE를 서비스하던 대역과 합해 광대역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돼 경쟁사에 맞설 수 있게 된다. 광대역 서비스는 LTE-A와 마찬가지로 두 배의 속도를 낼 수 있다.
관련기사
- 주파수 룰 받은 이통사, 대응 전략 골몰2013.08.11
- 이통3사 주파수경매 신청…'쩐의 전쟁' 시작2013.08.11
- 주파수경매 담합?…최문기 “공정위 예의주시”2013.08.11
- 정부, LTE 주파수 할당 공고...내달말 경매2013.08.11
1.8GHz 대역을 차지하기 위한, 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혈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미래부는 오는 19일, 혹은 20일경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경매 결과에 따라 최소 2년 이상의 통신시장 경쟁 판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매 방식이나 과정이 다소 복잡하지만 주파수의 주인은 국민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