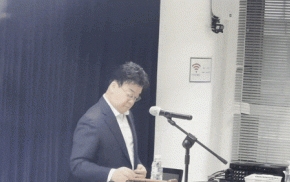최근 국산 네트워크 장비 산업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그 배경 중 하나는 외산 네트워크 장비의 보안 위협이다. 간단히 말해 “백 도어가 있을지 또는 악성 코드가 숨겨져 있는지 혹시 누가 아나?”라는 아주 오래 전부터 회자되던 이야기지만 지금까지도 유효한 주제이다. 혹시 국산 네트워크 장비 보호 정책 이야기가 나온 이유를 그저 업계가 그저 밥 그릇 지키기 위해서라고 본다면 너무 작은 부분만을 보는 편협한 시각이라 분명히 말하고 싶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어권 국가들은 대놓고 중국 기업의 제품을 보안상 이유로 쓰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미국은 화웨이, ZTE의 네트워크 장비들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구매 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레노보 역시 백 도어 이슈로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영미권 몇몇 기관에서 사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들 기관으로는 미국 CIA, NSA, 영국 MI5, MI6, 호주 SIS(Secret Intelligence Service) 등이 있다.

중국 기업이 만든 제품에 보안 문제가 있다는 이슈 제기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앞장서서 강조할 일이 아닌 듯 하다. 1990년 전쟁 발발 전에 이라크로 수출되는 컴퓨터에 NSA가 개발한 악성 코드를 심었고 이를 통해 이라크 방공망을 무력화 시킨 것은 유명한 일화다. 여기에 더해 최근 전직 CIA 요원이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NSA가 수년 간 중국과 홍콩을 대상으로 해킹을 진행해 왔다고 밝히면서 미국 정부가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실제로 국가 간 정보전 관점에서 볼 때 미국과 중국은 위험 국가로 낙인이 찍혀 있다. 일례로 EY라는 컨설팅 회사가 독일 기업 4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28%)에 이어 미국(26%)이 IT 보안 전문가들이 꼽는 위험 국가의 자리를 차지했다.
이처럼 자국 내 기업과 손을 잡고 국가에 득이 되는 일이라면 사이버 첩보 지원도 마다하지 않는 것은 보안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그 동안 국산 네트워크 장비를 공공 부문에서 외면해온 것을 떠올려 보면 국가 안보 차원에서 걱정이 앞선다.
그나마 올 들어 국산 네트워크 산업 보호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해 져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일각에서는 국산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보안 인증제 시행 등 업계에서 거론되는 보호책이 너무 과하다는 이야기도 한다. 하지만 사이버 첩보전이 엄연한 현실인 세상에서 너무 안이한 생각이 아닐까?
그나마 우리나라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토종 네트워크 업체들이 척박한 환경에서 그나마 뿌리 내리고 자생력을 키워 왔기 때문에 희망의 씨앗이 있다. 자국산 장비를 보유한 나라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미국, 유럽, 중국 등을 빼면 과연 몇 개 나라에서 자국산 장비를 쓸 수 있을까?
사실 그 동안 공공과 민수 모두 국산 장비 업체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Layer 2, 3 스위치 쪽은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에 시달리고, Layer 4, 7 영역에서 쓰이는 ADC(Application Delivery Controller) 부문은 미국 기업들의 선진 기술력에 대응하느라 벅찼다. 이런 조건 속에서도 국내 시장에서 All-IP 시대 보안 상 방어 요충지로 꼽히는 Layer 4, 7 계층 관련 네트워크 장비를 만드는 업체들은 외산에 견줄 수 있는 성능과 기능으로 시장에서 당당히 어깨를 겨루고 있다.
관련기사
- [칼럼]'HTML5' 기대도 실망도 마라2013.08.09
- 펌킨, 토종 기술로 ADC 시장 개척2013.08.09
- 고려아연 주총, 최윤범 회장 일단 승기...법적 분쟁 잔불 남아2025.03.28
- "車 샀더니 스마트폰 주네"…현대차 인포테인먼트 확 바뀐다2025.03.28
사이버 첩보 세상에 두 빅 브라더인 중국과 미국 기업들이 만드는 네트워크 장비, 언제까지 아무 생각 없이 쓸 것인 것인가? 모든 것이 IP를 통하는 ALL-IP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기반인 네트워크, 더 이상 국산과 외산 장비를 차별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산업 보안까지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 칼럼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